NASA, 2022년 추진목표 발표...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과제로 남아
NASA의 광폭 행보는 2022년에도 이어진다. 최근 2022년 추진 목표를 발표하며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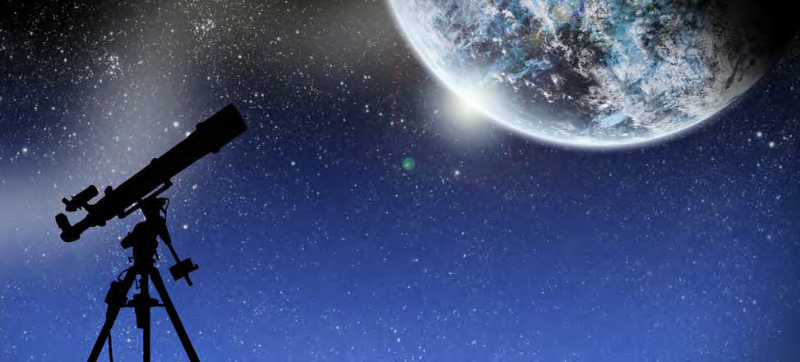
■ 주요동향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난 2월 10일 2022년 추진 목표를 발표했다. NASA는 이를 통해 제임스 웹(James Webb) 우주 망원경, 아르테미스 미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주 관찰에 대한 전례 없는 시도다. 망원경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빅뱅 이후 최초의 빛에서부터 지구와 같은 행성의 탄생, 태양계 형성과 진화 등 우주의 역사를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봄 발사 예정인 무인 달탐사선 아르테미스 1호기도 주목받고 있다. 이는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무인 조종을 통해 달 주위 타원형 궤도를 정밀 탐사하고, 무사 귀환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도 NASA는 화성 미생물 탐사 연구, 초음속 비행기 X-59 비행, 스페이스X와 협력해 국제우주정거장 왕복하기, 액시엄 스페이스와 함께 하는 첫 민간 우주 비행 임무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현황분석
일부 전문가들은 2040년 세계 우주경제 규모가 약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 전망 아래, 다양한 국가가 우주개발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선두그룹은 미국, 중국, 러시아다. 그 뒤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과 일본, 인도가 맹추격 중이다. 투자규모로 보면, 미국(약 48,000백만 달러)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규모를 자랑하며 중국(8,800백만 달러), 프랑스(4,000백만 달러), 러시아(3,700백만 달러)이 그 뒤를 잇는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약 700백만 달러로, 미국 투자규모 대비 약 1.5%, 중국 대비 약 8%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 전담조직도 중요하다. 미국은 NASA, 중국은 국가항천국, 러시아는 연방우주국이라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정부조직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서 투자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이후 민간 우주개발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블루오리진, 버진갤럭틱, 스페이스X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누리호 발사에 국내 기업 300여 곳이 참여한 만큼, 발전 가능성은 높다.
*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2018~2040) 데이터 참조
■ 시사점
최초 인공위성 발사체인 스푸트니크 1호(소련, 1957년)를 시작으로 익스플로러 1호(미국, 1958년), 최초 유인우주선 발사체 보스토크 1호(소련, 1961년), 머큐리-레드스톤 3호(미국, 1961년) 등 20세기 중후반 펼쳐진 우주 경쟁은 미국과 소련의 경쟁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가 우주 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2020년 기준, 각국이 운용 중인 수많은 위성의 수(미국 1,425개, 러시아 172개, 중국 363개, 영국 130개, 일본 78개)는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도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1996년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운용 위성은 17개(2020년 기준)에 달하며, 작년 10월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주개발 예산 및 인력 확대,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자력발사 성공 등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콘텐츠)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NASA는 우주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STEM-a-Thon, Million Girls Moonshot, EPSCo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NASA는 또한 우주개발 진흥과 확산, 문화·생태계 조성에도 적극적이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한 연구·기술 중심 우주개발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 공감과 이해, 문화와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기술개발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
<동향리포트>는 글로벌 과학기술문화, 과학·수학·정보 교육 분야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국가별 정책, 연구조사보고서, 유관기관 동향 등 시의성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